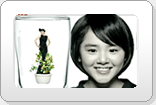
초등학교 때 집안이 넉넉한 아이들은 빵하고 우유를 신청해서 받아먹었다. 아마도 낙농업 장려 차원에서 학교를 통해 우유 소비를 권장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때는 우유가 흔치 않아 지금처럼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아줌마들도 없던 때였다. 수업을 모두 마치고 주번이 교무실 혹은 양호실로 가서 빵과 우유를 타 가지고 몇몇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비로소 종회가 시작되고 학교가 파했다.
한 반에 급식(엄밀한 의미에서 급식은 아니었는데 그렇게들 불렀던 것 같다)하는 아이가 10-20명 정도 되었을까? 그때는 말 그대로 콩나물학급이라 한 반에 70-80명 정도가 되었으니 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이는 10-20% 정도에 불과했다.
한 달에 얼마씩을 내고 신청을 해서 급식을 받는 아이들 외에도 반에서 3-4명 정도는 불우 이웃돕기 차원에서 무료로 급식을 받았던 기억도 난다. 그리고 각 반마다 담임선생님이 급식 먹는 아이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유난히 지기 싫어하는 선생님의 경우 급식신청을 좀더 많이 하도록 아이들을 종용하는 분도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번도 급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옥수수빵과 우유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상하게도 엄마에게 급식 신청하겠다고 조르지 못했다. 위로 언니 둘, 특히 욕심 많은 둘째언니는 늘 급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는 너무도 눈치가 빤해서 엄마 주머니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니에게 급식받은 빵을 남겨다달라고 조르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었다. 치사하게도.
선생님이 아무리 우유가 얼마나 아이들 성장에 좋으며, 우유를 소비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고 나아가 애국애족하는 길임을 역설하여도 나는 선생님의 말씀보다 엄마의 한숨소리가 더 절실하게 다가왔다.
몇 학년 때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번은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러 너희 집은 형편도 나쁘지 않은데, 왜 급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아도 몸에 좋은 것이니 너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급식을 시키지 않는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다. 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를 아이에게 무관심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나쁜 엄마로 모는 듯한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에 상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난 우유를 좋아하지 않으며 우유를 먹으면 속이 거북하기 때문에 급식을 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거짓말을 했다. 엄마는 내 말을 믿고 내가 정말로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지만, 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아무래도 바깥활동이 적었던 나는 늘 집안에서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낱낱이 듣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대가족을 돌보느라 늘 쪼들리던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집안의 누구누구 결혼식, 장례식, 제사와 병치레, 생일 등 맏며느리로서 치러야 할 집안의 대소사가 끊이지 않는데다 다섯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아버지 혼자 벌어서는 늘 넉넉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엄마의 한숨소리와 푸념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어야 했던 나로서는 덥석 급식을 신청할 수가 없었다. 나라도 엄마의 짐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았다. 아니, 그런 기특한 생각 이전에 엄마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비를 하겠다고 엄마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빵과 우유를 먹고 싶은지 아닌지는 언제나 둘째 문제였다.
돌이켜보면 어린아이답지 않게 왜 그렇게 오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왜 거짓말까지 둘러대며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른들이 좋아할 행동만 하려고 했는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스스로의 욕구에 충실한 만큼 그에 따른 비난도 감수하고 책임도 져야 하지만(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룰을 어기거나 자신의 욕구를 앞세울 경우 몇 배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충족감은 없지만 늘 안정적이고 칭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무언가 조르지 않는 착한 딸, 억지 부리지 않는 착한 아이라는 평가에 점점 안주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발달해 있다. 어쩌면 내가 무얼 원하는지 보다(중요한) 상대방이 무얼 원하는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게 재빨리 파악한 상대방의 욕구에 부응해 나는 쉽사리 내 욕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욕구에 나 자신을 맡기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포기한 나 자신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는 있을지언정 그 욕구 자체는 절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욕구에 편승해서도 행복하거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상대방의 욕구에 쉽사리 편승해 놓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곤 한다. 상대방이 내게 희생을 강요한 적이 없기에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피해의식인데도 말이다. 나는 내 욕구를 포기한 대신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고, 누군가와 부딪치지 않아도 되는 평화와 착한 아이라는 칭찬까지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일 뿐이었다.
이렇듯 욕구를 억누른 채 눈치, 코치를 무기로 맺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왜곡되기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헌신, 희생을 가장한 불평등한 인간관계는 내 젊은 날 성숙한 자아형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착한 척했지만, 진짜 착한 장애인이 되지 못한 탓일까. 어쩌면 나는 비판적, 회의적인 면이 발달해 있는 반골기질 때문에 착한 장애인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리고 이런 기질은 아마도 엄마와 외할머니로 대표되는 외가쪽 기질을 고스란히 닮은 탓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