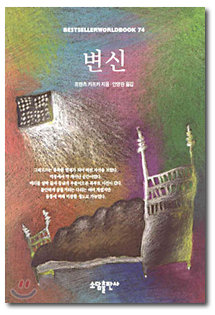
"어느 날 아침, 평범한 샐러리맨 '그레고르 잠자'는 거대한 갑충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격렬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들이다. 모두가 착실한 아들 대신 남겨진 벌레를 증오하며 그를 유폐시킨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오래된 문학 작품중의 일부이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많다. 그 대상은 치매 걸린 노인, 혹은 장애인, 때로는 정신병자로도 표현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었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게 가장 먼저 그를 유폐시키고 증오하는 건 다름 아닌 바로 가족이다.
오늘날 가족이라는 의미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와 닿을까. 물론 장애인을 벌레로 표현하려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벌레라는 매개체를 사용함으로 해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고 약한 것인지,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뭔가 다른 생물이었다면, 사람들은 좀더 주인공의 입장에 섰을지 모르지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벌레라면. 주인공의 소외감과 외로움도 뼈저리게 알고 있지만 그를 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말이다.
번듯한 가족만을 꿈꾸는 가족주의의 만연은 바로 가족의 위태로움을 가져온다. 고급과외, 조기유학까지 가족사랑이라는 명목아래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이 속에서 또 장애인 자식은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될까.
내가 상처 받기도 전에 미리 걱정해서 나를 보호해 주었던 가족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어른이 다 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 주었을까. 물론 짧은 옛 기억들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게 자신의 주체성 보다는 가족의 보호아래서 자라난 장애인은 말 잘 듣는 착한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것을 밖으로 잘 해소할 수 없는 경우의 장애인일때,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온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 화풀이 대상은 또 가족들이 된다. 그것들은 또 장애인 자신이 안고 넘어야할 아픔이 될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직도 넘치는 가족의 보호아래서 생활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위험한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출구가 필요할 것이다.
